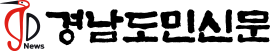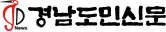이호석/합천 수필가

이호석/합천 수필가-가끔 하늘을 쳐다본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다. 산도, 들도, 하늘도 항상 건성으로 바라본다. 스마트폰과 TV, 도로와 그 도로를 따라 곳곳에 무리 지어 있는 웅장한 콘크리트 군상들만 쳐다보며 사는 것 같다.
내가 어린 시절,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여름날 저녁이면 모깃불 연기가 자욱한 마당에 덕석을 깔고, 희미한 남포등 아래 온 식구가 둘러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우리 형제들은 집 옆의 작은 도랑에 가 찬물을 끼얹고 돌아와 덕석 위 할머님 곁에 누워 구수한 얘기를 기다린다.
때로는 반듯하게 누워 밤하늘을 쳐다본다. 가끔은 초승달이 씽긋이 윙크하며 지나갈 때도 있지만, 캄캄한 장막에 푸른 은하수가 강물처럼 쏟아져 내릴 것 같았고, 한편에서는 북두칠성이 넌지시 내려다본다. 언제 봐도 밤하늘은 셀 수 없이 수많은 꼬마전구로 잘 꾸며진 신비롭고 광활한 무대였다. 특히, 칠월칠석 때가 되면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오작교와 그 위에서 만나는 견우와 직녀를 상상하며 내 마음이 설레기도 했다.
이런 여름날 저녁이면, 할머니는 긴 담뱃대 끝에 봉초 담배를 꾹꾹 다져 넣고 불을 붙여 맛있게 빨아대며 구수한 이야기보따리를 푼다. 주로 일제강점기 때 가난에 떠밀려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삼촌, 고모를 데리고 저 멀리 만주벌판으로 가 전답을 일궈 살면서 고생한 얘기,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겪었던 6.25 한국전쟁의 참상을 얘기하여 마음을 아리게 하지만, 수시로 곁들이는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의 옛날얘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고 감칠맛이 났다.
1960연대 중반에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온 후부터 마을의 모습이 서서히 바뀌었다. 몇몇 집에 라디오가 보급되는가 싶더니, 얼마 후 흑백 TV가 띄엄띄엄 보이기 시작했다. 전깃불로 마을의 밤이 차츰 밝아지면서 밤하늘은 조금씩 멀어졌고, 구수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뜸해졌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나는 꿈도 소박했다. 우선 국방의 의무를 마쳐야 하고, 알맞은 일자리도 구해야 했다. 스물한 살의 나이에 직업군인을 할 생각으로 육군 부사관에 자원입대를 했다. 칠흑 같은 밤, 홀로 보초를 나가 처량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쳐다본 밤하늘은 너무나 달랐다. 집에서 할머니의 부채질을 받으며 호랑이 얘기를 듣던 그때의 밤하늘이 아니었다. 언제나 고향의 부모 형제와 친구들, 보고 싶은 얼굴들이 그려지는 그런 밤하늘이었다.
5여 년 간의 군 생활을 중도에서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 밑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전역을 하고 3년 차가 되던 1972년 가을, 아버지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몇 달 후 합천군에서 공무원 시험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쳐보라고 했다. 나는 전역 후 짧은 사회생활에서였지만, 앞으로의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몇 달 후 치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1974년 1월 합천면사무소에 첫 발령을 받았다. 비포장 자갈길로 자전거를 타고 관내 출장을 다녔다. 가다 오다 길옆 나무 그늘에서 동료들과 잠깐 쉴 때면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사회 초년생으로, 새로 이룬 가정의 번성과 직장에서의 승진을 생각하며 또 다른 장밋빛 꿈을 한 것 그려보곤 했다.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희를 지났다. 오늘도 모처럼 푸른 하늘을 쳐다본다. 청운의 꿈을 그리던 그 젊은 날의 희망찬 하늘이 아니다. 보람 있고 아름다운 여생을 생각하게 하는 하늘이다. 항상 건강하고 편안하기를 기원해 본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